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구름 사이로 솟아오를 때,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한결같다. 그러나 착륙한 공항의 시계는 다르게 흐른다. 어제의 태양 아래서 떠난 사람이 오늘의 아침을 맞이하거나, 반대로 하루를 건너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 이 차이를 우리는 ‘시차’라 부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다. 인간이 시간을 나누고 조정한 끝에 탄생한 질서이자, 때로는 혼란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과거, 시간은 지역적 개념이었다. 태양이 머리 위에 걸리는 순간이 정오였고, 도시마다 시간이 달랐다. 그러나 철도가 등장하며 변화가 찾아왔다. 19세기 중반, 기차가 여러 지역을 빠르게 넘나들게 되면서 일정한 시간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4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자오선 회의에서 전 세계를 24개 시간대로 나누는 방안이 채택되었다1. 본초 자오선이 지나는 영국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세계시(UTC)가 정해졌고, 각국은 이를 따라 시간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일부 국가는 독자적인 시간대를 유지하거나 조정했다. 예컨대 중국은 거대한 국토를 가로지르면서도 단일 표준시를 따른다. 반면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를 유지한다. 인도는 30분 단위로 시간을 설정하여 표준시를 조정했다.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조율되는 사회적 구조인 셈이다.
시차는 개인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선을 타고 대륙을 넘는 여행자들은 ‘시차 증후군(jet lag)’에 시달린다. 몸은 아직 떠나온 시간에 머물러 있는데, 환경은 새로운 시간으로 강제한다. 수면 패턴이 깨지고, 소화 기능이 흐트러진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적 비용으로도 연결된다. 연구에 따르면 시차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항공 여행이 잦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2.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 시차 적응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시차 적응을 위해 수 주 전부터 현지에 입국하기도 한다.
미래의 시차는 어떻게 변화할까? 초고속 이동 기술이 발전하면 시차의 체감 강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가령, 하이퍼루프 같은 첨단 교통 수단이 실현되면 대륙 간 이동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십 분 내로 가능해진다3. 이럴 경우 인체의 생체시계가 이를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글로벌 실시간 협업이 증가하면서 ‘지역 시간’ 개념이 희미해지고, UTC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시간 체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기업과 국제 기관들은 이미 UTC를 기준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생체적 리듬을 고려할 때 완전한 통합은 쉽지 않다.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공간과 우리의 몸이 맺는 관계 속에서 조율된다. 우리가 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맞춰 변화해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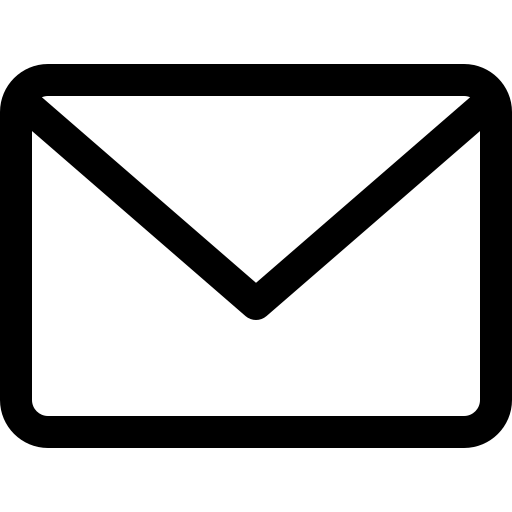 이메일로 보내기
이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