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생명이 멈추는 순간, 공기는 무거워지고 시간은 길게 늘어진다. 살갗을 스치는 바람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끝내 다가설 수 없는 신비다.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던진다.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소멸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가. 종교, 철학, 과학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해왔다.
역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다.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다. 불교는 윤회를 강조하며 죽음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중세 유럽은 죽음을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포장했다. 페스트(흑사병)가 도시를 휩쓸었을 때, 사람들은 죽음을 신의 형벌로 여겼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위엄을 찾으려 했다. 장엄한 초상화와 기념비 속에 영원을 담고자 했다. 현대에 들어서며 죽음은 신비로운 영역에서 벗어나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로 변했다.
오늘날 죽음은 의료와 기술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생명 연장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뒤로 미루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가 늘어날수록 죽음의 의미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과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명을 앗아갔다. 지금은 기계가 생명을 연장하는 순간을 결정한다. 임종(臨終)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언제, 어떻게 삶을 마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가 발전하며, 죽음을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끝까지 연장하려는 욕망도 강해지고 있다.
죽음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존엄사와 안락사는 인간다운 죽음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가. 어떤 이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는 생명의 신성함을 내세운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禁忌)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임종을 조용히 감춘다. 미디어는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점점 죽음을 모른 척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반면, 일부 문화에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념하며 축제처럼 보내기도 한다. 멕시코의 ‘망자의 날’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한가운데 있다. 그것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비로소 죽음의 실체를 깨닫는다. 죽음은 공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말한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죽음은 철학적, 윤리적 논쟁을 넘어서서 예술과 문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수많은 문학작품이 죽음을 이야기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
미래의 죽음은 어떨까. 생명 연장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죽음은 점점 더 지연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랄까. 죽음을 극복한 존재는 더 이상 인간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될까.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생의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불멸의 존재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소중히 여길까. 아니면, 삶의 가치가 흐려질까.
죽음은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쪽이든,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을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죽음을 성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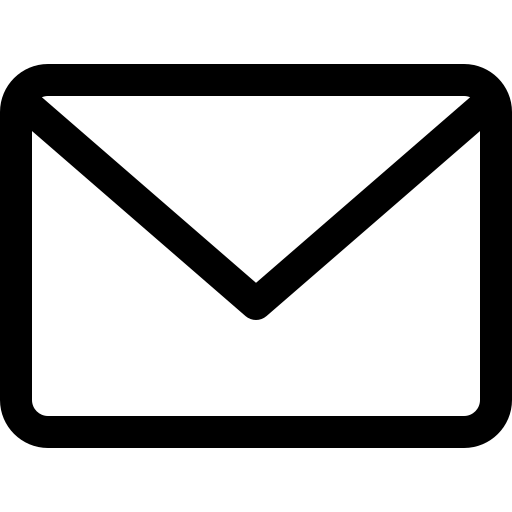 이메일로 보내기
이메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