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웰다잉Well-dying’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웰다잉’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잘 죽는다’는 뜻이다. 아직 그 정의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웰다잉’이란 말이 아직 낯설어도, ‘웰빙Well-being’이란 말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아보니 좋다더라”, “아니, 내가 직접 해보니 그건 별로던데.” 같은 대화를 통해 찾아가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이 곧 ‘웰빙’이다.
‘웰다잉’은 그것을 죽음에 적용한 것이다. ‘웰빙’의 죽음 버전이 곧 ‘웰다잉’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웰다잉’이란 저마다 꿈꾸는 이상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예컨대, 의사들은 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가급적이면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다.
하지만 죽음에는 또 다른 면도 있다. 인류 역사상 죽음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고민해온 주제도 드물다. 종교나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인류가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이해해 온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궁금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가장 금기시되는 대상인 죽음. 사람들은 어째서 죽음에 대해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일까. 수많은 종교와 문화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그 힌트가 될지도 모르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솝 우화 ‘여우와 신포도’.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야기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여우가 나무 위에 매달린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한다. 하지만 포도가 나무 위에 너무 높이 매달려있어서 여우는 도저히 닿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포도를 따먹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던 여우는 결국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현실을 깨닫는다. 여우는 마음속으로 ‘저 포도는 분명 신포도가 분명해.’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린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대할 때, 여우가 나무 위에 높이 매달린 포도를 바라볼 때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그냥 눈을 감고 문제를 무시해버린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보다 이해하지 않아 버리는 것이 마음은 한결 가볍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존감에 상처를 덜 입는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싶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니 그전에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죽은 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기는 한 건지. 우리는 죽음에 관해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여우의 길을 택한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면 안 될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죽음이라는 미궁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부담을 직면하는 대신, 차라리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신포도로 만들어 버린다.
요즘 ‘웰다잉’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몇 년 전에 EBS에서 방영했던 3부작 다큐멘터리 생사탐구 대기획 『데스Death』가 떠올랐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본방송이 아니라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로 보았는데, ‘죽음’이라는 평소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풀어낸 수작秀作이었다.
기존의 TV 프로그램들 중에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검증되지 않은 사후세계를 다루며 흥미위주로 구성하거나 출연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며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그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사뭇 달랐다. 호기심 위주나 감성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죽음이라는 하나의 피사체를 역사학, 물리학, 심리학 그리고 의학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의 렌즈를 통해 다각도로 보여주었다.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 번 다루어보겠다는 제작진들의 의지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간 내내 느껴졌다.
『좋은 죽음 나쁜 죽음 EBS 『데스』제작팀 , EBS NEDEA (기획) 지음 | 책담 | 2019년 01월 10일 출간』은 이 3부작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것이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아 어떻게 내어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식사가 되듯, 다큐멘터리와 책은 같은 내용을 다루었을지라도 서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다큐멘터리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보기만 해도 즐기기에 큰 무리가 없지만,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며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물론 그 수고스러움 덕분에 스스로 완급을 조절해가며 내용을 곱씹어보고 핵심 주제를 찾아가며 사색할 수 있다는 건 독서의 장점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는 이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라고 할 만하다. 더욱이 이 책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 여러 명과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에 관한 더 많은 대화’야 말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죽음이라는 금기 아닌 금기를 마주할 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다큐멘터리나 책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 ‘웰다잉’은 우리 일상 속에 저절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지 않을까.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말마따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인지도 모를 일이다.
Next다음 글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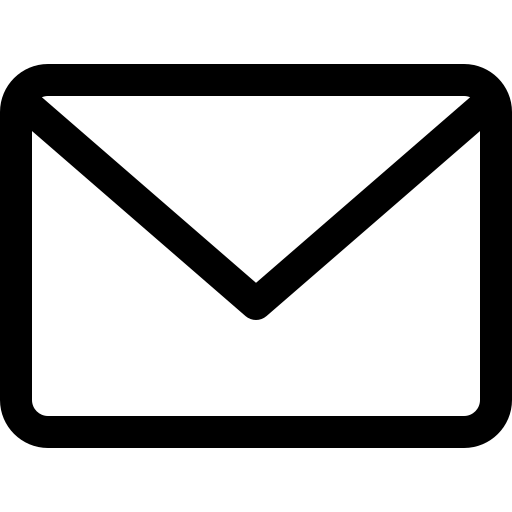 이메일로 보내기
이메일로 보내기
노후준비를 걱정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아이러니…
좋은 글 진지하게 잘읽었습니다
웰다잉에 대해 많이 대화 나누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나이 들어가니 죽음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게 아니라 당연하게 다가오네요.
하지만 죽음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죽음과 삶을 다룬 책을 많이 읽고 있네요.
감사합니다.